Archive Page 8
연애시대
이 TV드라마가 방영되었던 것이 2006년이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아마도 네 번째나 다섯 번째로, 다시 꺼내어 본다.
이렇게 지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들춰보게 되는 이유는 늘 비슷하다. 잠을 이루기 힘든 새벽, 불현듯 머리속에서 한 장씩 넘어가기 시작하는 강렬한 이미지들을 모른척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극 중 남자 주인공 동진의 나이는 32세다. 스물한살 갓 입대한 이등병의 신분으로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며 울고 웃으며 인생을 조금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서른이 되어 다시 같은 장면을 보며 그 때의 나와 감정을 공유한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첫 눈에 반한 상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잃고, 헤어져서 3년을 보내고, 고통과 노력의 시간 끝에 다시 나른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얻어낸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여전히 ‘어른들의 이야기’이다.
그 때 적었던 글을 읽으며 강해지고 싶어하는 나를 본다. 앞으로 다가올 슬픔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단련하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의 내가 떠올라 미안하고 부끄럽다.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걸까.
(Published 2006/05/29.)
인간에게 무척 커다란, 일상생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슬픔이나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불행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너무 깊히 박혀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다. 이 때 나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무기는 망각과 체념이다. 시간이 인간에게 뜻하지 않은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과 맞물리면서 그를 살게 한다. 인간이 나이가 들어 가면서 “강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비굴한 방어에 익숙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음 속에 커다란 가시가 수없이 박혀 있는 중에서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처럼 서로 유머를 나누고 시시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 추구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서는 때때로 찾아오는 행복의 시간에서, 극중 은호의 말처럼 “염치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 끝에는, 결국 언제나처럼, 지금 이 시간을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장면의 나레이션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
행운과 불행은 늘 시간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달려든다.
우리의 삶은 너무도 약하여서 어느날 문득 장난감처럼 망가지기도 한다.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끝날지라도 그리하여 돌아보면 허무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은 진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애달아하면서,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
소설
부끄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리 많은 소설책을 읽지 않았다. 내가 읽는 책들의 80% 이상이 비소설류(수필, 인문/사회/자연과학, 여행기, …)이다. 한국의 서점에 가면 항상 스테디셀러 자리에 있는 “상실의 시대” 를 비롯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아직 한 권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고, 몇 달 전 큰 마음먹고 도전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겨우 다섯 페이지를 넘기지 못 하고 접었다. 이번에 신간이 나온다고 해서 관심이 생긴 밀란 쿤데라의 소설은 읽기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분의 일도 읽지 못 한 상태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이라면 알랭 드 보통의 연애소설 몇 권이나, 할리우드 영화 같은 기욤 뮈소의 소설 몇 권이 전부.
나는 소설을 읽을 때면 과도하게 비판적이 된다.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필보다 더 솔직하다.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소설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수필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볼 때에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공감하고 동정하며 관대한(?) 마음으로 읽지만 소설을 읽을 때는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겨우 이 정도 이야기밖에 만들지 못 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렇다고 내가 더 이야기를 잘 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강남역에 있는 한 중고 서점에 다녀왔다. 고등학교 학습실에 내 친구들의 책상 위에 많이도 널부러져 있던 파란색과 주황색 세트의 “냉정과 열정 사이”.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성격 탓에 나는 이 소설을 아직도 읽지 않았었다. 그래도 다른 읽고 싶은 책을 찾지 못 한 까닭에 칠천 원을 주고 이 두 권을 들고 서점에서 나왔다.
지금 나는 미국 보스턴 근처 소머빌이라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다. 서점 한 귀퉁이에 마련되어 있는 이 작은 카페는 내가 주말 오후에 자주 찾는 곳이다. 창문가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창 밖으로 작은 테라스와 주차장이 보인다. 주택지가 많은 동네라 지나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가족들이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인다. 보스턴은 10월부터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동네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천사의 곱슬곱슬한 금빛 머리카락이 서늘한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의 주황색 책을 읽고 있다. 그리고 가을이니까 당연히, 노라 존스의 음악을 듣는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독서를 방해한다. 며칠 전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읽은 The Atlantic 지에서 “인터넷이 인간의 ‘읽기’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 라는 주제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말하기, 듣기와는 달리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작업은 후천적으로 훈련되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작업인데, 컴퓨터 화면에 주사된 글을 대충 스크롤하는 현 세대의 읽기 작업은, “죄와 벌”을 몇주(또는 몇달)에 걸쳐 읽으면서 훈련된 두뇌의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요즘들어 나이먹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나의 뇌는 ‘신세대 두뇌’ 인가보다. 겨우 이십 페이지 정도를 읽으면서 떠오른 잡생각이 열 가지가 넘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더 감성적인가, 라이트 로스트 커피는 왜 신맛이 강한가, 내가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왜 사람들은 감자칩을 좋아하나,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가 벌써 됐는가.. 등등.
파란색 책을 읽고 있던 나를 생각해본다. 지금의 나와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내 방의 침대 위, 시간은 새벽 3-4시경, 그리고 아무 음악도 듣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꽤나 잘 어울리는 광경이다. 어머니가 만든 집에서 지난 기억들을 마약처럼 씹고 있던 나와, 떠나간 사랑에 미련하게 매달리는 남자 주인공.
창문에 빗방울이 지저분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 생각의 화살표를 현실로 돌려 놓는다. 주말 오후의 한가로움을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창문 밖의 쌀쌀한 냉기가 어느새 내 무릎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오늘 저녁에는 또 무얼 먹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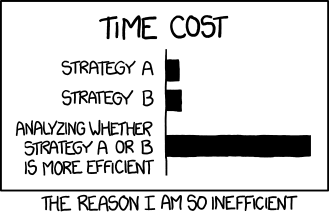
 RSS
RSS

